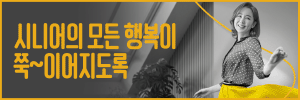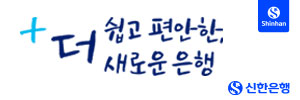사진=현대차 홈페이지 싼타페
지난 6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DM R2.0 2WD’는 국토교통부에 ‘연비 뻥튀기’ 지적을 받았다. 현대차가 발표한 싼타페 연비 14.4㎞/ℓ가 허용 오차 범위 5%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4.4㎞/ℓ의 연비는 현대차가 자의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아니다. 이 연비는 산업부의 사전인증을 거쳐 내놓았다.
연비 산정 방식은 사전인증과 사후인증 두 가지가 있다. 사전인증은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커가 쉬운 예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출한 연비 자료를 조사해서 산업부의 검증을 통과하면 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사후인증은 시판된 차량을 제원표에 표기된 연비와 일치하는지 무작위로 검증하는 작업이다. 지난 2012년까지는 이 모두를 사실상 산업부에서 모두 처리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국토부도 연비 검증에 뛰어들었다. 그전까지 국토부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그대로 썼다. 2013년부터 국토부가 국산 승용차와 수입차 일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를 직접 실시했다. 이때부터 자동차 업계에 혼란이 발생했다. 사전검증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사후검증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연비 조사 조건이 일치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현대차 측은 “차량의 연비는 수없이 많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운전습관은 물론이고 바람의 영향, 차의 무게, 도로 표면, 타이어 상태, 엔진 길들이기 등에 따라 천지차이”라며 “조건 설정에 따라 연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싼타페 ‘연비’ 논란에서도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두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양쪽 모두 재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국토부가 재검증에서 적합 판정으로 바뀌게 되면 담당자는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부적합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자동차학과 교수도 “업계에서는 당시 국토부의 연비 재검증이 현대차에 가혹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가 스스로 싼타페에 내세운 부적합 연비를 관철시키기 위해 쉽지 않은 조건을 설정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었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연비 재검증을 발표한지 2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토부의 재검증 연비 결과인 13.5㎞/ℓ 대신, 산업부 결과인 13.8㎞/ℓ로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싼타페는 똑같은 차를 두고 스티커와 제원표의 연비 기록이 다르게 제시된다. 산업부 사전검증을 통과해 붙인 스티커와 국토부·산업부 재검증을 거쳐 수정하게 된 제원표 연비가 서로 다른 것이다.
앞서의 자동차 전문가는 “현대차로서도 난감한 면이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