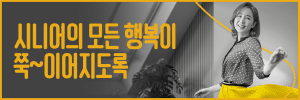순찰차 내부엔… 주취자 오바이트 잦아 뒷좌석엔 에나멜 처리, 바닥엔 개폐식 배수구
한국 최초의 경찰차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광복 직후에 쓰인 경찰차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다. 미군정 당시 미군이 쓰던 군용지프(jeep)에 다른 색을 칠해 경찰차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반 자동차에 특정 표식이 담긴 깃발을 꼽아 경찰차로 썼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1948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수도경찰청에서는 금후 자동차에 붉은 바탕에 흰빛으로-영어로 경찰(POLICE)이라-적힌 삼각형 깃발을 단 자동차는 공용 경찰자동차인 것을 표시한 것이므로, 일반 경관은 취체(단속)치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

50~60년대 미군 주력 지프 ‘윌리스’ 개조…차체 온통 흰색
6·25 전쟁 이후 1950~60년대를 풍미한 경찰차는 ‘백차’라고 불렸던 흰색 지프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주력 지프이던 ‘윌리스’ 지프차를 일부 개조해, 차체를 흰색으로 칠하고 앞유리창 아래 부분 등에 검은색으로 ‘경 POLICE 찰’이라 적어 경찰차로 사용했다. 원래 흰 칠을 한 경찰차를 의미하는 ‘백차’라는 단어도 여기서 유래했다.
정반대로 검은색 지프에 흰색으로 ‘경찰’ 글자를 표기한 순찰차도 함께 쓰였다. 이 시절 차량 지붕 위에 다는 경광등은 붉은색 원통 모양이었다. 훗날 경찰순찰차의 ‘백차 시대’를 대체한 것은 검은색 차체에 지붕에는 붉은색 경광등을 단 세단이었다.

70년대 흑색+흰색 ‘뉴 코티나’ 최고시속 160km 달해
1972년 12월 21일자 <경향신문>에는 “서울시경이 검은색인 교통순찰차의 색깔을 청백색으로 바꾸고, 붉은색 경광등도 청색으로 바꾸도록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은색 교통순찰차가 시민들에게 위압감과 부담감을 준다고 여겨, 평화와 안정을 나타내는 하늘빛 청색 바탕에 흰 다이아몬드형 표지를 넣는 것으로 차량 색상을 바꾸려 했던 것. 하지만 시경의 참신한 시도는 불과 한 달도 못 돼 물거품이 되고 만다. 당시 치안국이 “시민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 색상으로 환원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흑색 위주이던 순찰차의 색상도 시대 흐름에 따라 차츰 변화를 맞게 된다. 이후 검은색과 흰색 배색으로 도색된 순찰차가 등장했는데, 이때 사용된 차량은 미국 포드사와의 기술제휴로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던 ‘뉴 코티나’였다. 1971년 출시돼 5년 뒤 단종된 차량으로 최고 78마력에 최고속도는 시속 160㎞에 달했다. 당시만 해도 경찰순찰차는 파출소나 지서에는 배정되지 않았고, 경찰서 단위로 운용됐다. 파출소에서는 사이드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경찰의 발’ 역할을 했다.

80년대 청색+흰색…경광등은 원통형에서 장방형으로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순찰차의 색상은 1983년 하늘색(청색)과 흰색 배색으로 바뀌게 된다. 붉은색 원통형 경광등도 이때부터 양쪽에 적색 램프를 단 장방형으로 교체됐다. 적-청색의 경광등을 단 교통순찰차가 등장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창설 60주년을 맞던 2005년, 경찰이 CI 통합작업을 벌이면서 경찰차의 색상과 디자인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청색과 흰색의 단조롭던 차량 디자인이 흰색 바탕에 청색과 노란색 띠의 배색에 경찰의 새로운 로고가 결합된 세련된 스타일로 바뀌게 된 것. 이후 경광등도 계속 ‘진화’해 2011년부터는 ‘POLICE’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LED 경광등이 도입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3000㏄급 포드 토러스 수입…고속도로 순찰용
2000년대 초중반에는 수입차가 경찰차로 쓰이기도 했다. 2001년 ‘한-미 자동차 교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미국 포드사의 3000㏄급 토러스 모델을 들여와 국내 고속도로 순찰차로 사용했던 것. 하지만 이때를 제외하면 경찰순찰차로 쓰인 차량은 모두 국내 메이커 모델이다. 누비라 아반떼 쏘나타 뉴라세티 SM3 SM5 등 국내 메이커들의 중형차 모델 중 상당수가 그간 경찰차로 납품됐다. 그렇다면 경찰순찰차는 동일 모델의 일반 차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순찰차의 속도와 성능은 일반 차량과 다를 바가 없지만, 내부 구조와 설비는 경찰 업무에 적합하도록 꾸며져 있다. 무전기와 앰프, HID 서치라이트 등은 기본. 이를 동시 조작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박스, 차량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상시 촬영해 저장하는 ‘블랙박스’도 갖추고 있다. 112 신고로 지령이 내려오면 별도 조작 없이도 신고 장소가 표시되고, 신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스마트한 내비게이션도 빼놓을 수 없다. 주행 혹은 주정차 중인 차량을 1초에 1대씩 검색해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자동 판독기’도 달려 있다.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이 파악될 경우 경고음이 나온다. 또한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유리창은 도주나 사고를 막기 위해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제작돼 있다.
이러한 장비가 과학 발전이 반영된 현대식 설비라면, 세태 특히 ‘주폭’ 문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재래식(?) 설비도 있다. 순찰차 내부에는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이 칸막이는 뒷좌석에 태운 피의자 등이 혹시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앞좌석의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특히 뒷좌석에 탄 취객들이 앞좌석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사례가 많은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취객들이 토하는 경우도 잦아 뒷좌석 시트는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에나멜 처리가 돼 있고, 바닥에는 따로 작은 개폐식 배수구까지 있다. 이렇게 순찰차는 범죄와의 전쟁뿐 아니라 주사와의 전쟁도 치르고 있다.
이정수 프리랜서